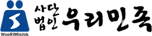한반도 정세 ‘북핵 폐기’ 협상국면으로 성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05 09:17 조회3,794회 댓글0건본문
기사입력 2009-10-05 08:25
[한겨레] 중 원자바오 총리 방북
1999년 진행 ‘페리 프로세스’와 비슷한 움직임
“내년 상반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분석도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은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북-일 관계 정상화로 진행되던 ‘페리 프로세스’에 비견되는 움직임이다.
우선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8월4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9월19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통해 조성된 북핵 협상 국면에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미·중은 7월 말 전략대화에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9월 말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양자 협의 등 중국을 중재로 한 북-미 3자 협의를 진행시켜 왔다. 다이빙궈-강석주 그리고 다이빙궈-스타인버그의 3자 대화 채널이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이런 협의를 정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11월 중순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전후해 중국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월 말로 예상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은 6자회담 수석대표라기보다는 99년 페리 조정관의 방북에 버금가는 오바마 대통령 특사로서의 비중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 9월20일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상당히 건강한 상태이며,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정상 차원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9월15일 북-미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조처에 상응해 미국이 미-북 관계 정상화, 체제 보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등을 밝힌 것은 다이빙궈가 방북했을 때 북한에 전달한 미국의 메시지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등에서 북핵 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대타결)은 최근의 북한 움직임을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로 간주한 판단과도 모순되고 사전 조율 등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만, 이런 흐름을 읽고 나온 것이다. 실제로 9월18일 미국 정부의 전·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가한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비공개 회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막연한 전망은 아닌 셈이다.
이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문에 대해 북한은 <로동신문> 3일치 사설에서 “조-중 친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례적인 언급일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온 것에서 보이듯이 중국의 강화된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방북 직후인 9일 베이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이명박 대통령과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북한은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일 관계 정상화에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하토야마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일 평양선언을 기초로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는 북핵 폐기의 결단을 위한 전략적 협상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의 특사 방문을 조문사절 면담 차원으로 격하시킨 데 이어 이산가족 상봉도 ‘수동적’으로만 진행했을 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뚜렷한 의지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kankan1@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 중 원자바오 총리 방북
1999년 진행 ‘페리 프로세스’와 비슷한 움직임
“내년 상반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분석도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은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북-일 관계 정상화로 진행되던 ‘페리 프로세스’에 비견되는 움직임이다.
우선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8월4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9월19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통해 조성된 북핵 협상 국면에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미·중은 7월 말 전략대화에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9월 말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양자 협의 등 중국을 중재로 한 북-미 3자 협의를 진행시켜 왔다. 다이빙궈-강석주 그리고 다이빙궈-스타인버그의 3자 대화 채널이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이런 협의를 정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11월 중순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전후해 중국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월 말로 예상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은 6자회담 수석대표라기보다는 99년 페리 조정관의 방북에 버금가는 오바마 대통령 특사로서의 비중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 9월20일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상당히 건강한 상태이며,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정상 차원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9월15일 북-미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조처에 상응해 미국이 미-북 관계 정상화, 체제 보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등을 밝힌 것은 다이빙궈가 방북했을 때 북한에 전달한 미국의 메시지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등에서 북핵 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대타결)은 최근의 북한 움직임을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로 간주한 판단과도 모순되고 사전 조율 등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만, 이런 흐름을 읽고 나온 것이다. 실제로 9월18일 미국 정부의 전·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가한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비공개 회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막연한 전망은 아닌 셈이다.
이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문에 대해 북한은 <로동신문> 3일치 사설에서 “조-중 친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례적인 언급일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온 것에서 보이듯이 중국의 강화된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방북 직후인 9일 베이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이명박 대통령과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북한은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일 관계 정상화에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하토야마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일 평양선언을 기초로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는 북핵 폐기의 결단을 위한 전략적 협상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의 특사 방문을 조문사절 면담 차원으로 격하시킨 데 이어 이산가족 상봉도 ‘수동적’으로만 진행했을 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뚜렷한 의지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kankan1@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